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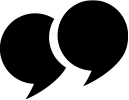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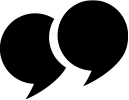
알프레드 히치콕의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에는 영화사에서 가장 매혹적인 기차 식당칸 장면이 등장한다. 살인 누명을 쓰고 도주하던 로저 손힐이 기차 식당칸에서 미모의 낯선 여인 이브를 만나는 장면이다. 흔들리는
차창 너머로 풍경이 스치고, 와인잔을 사이에 둔 채 두 사람은 서로의 진실을 숨긴 채 팽팽한 탐색전을 벌인다. 가장 평온해 보이는 식탁 위에서 가장 위험한 대화가 오가는 명장면이다. 대사에 등장하는 ‘20세기
한정열차’는 당시 뉴욕과 시카고를 오가던 최고급 럭셔리 열차로, 승객을 맞이하기 위해 승강장에 깔았던 진홍색 카펫이 오늘날 ‘레드카펫’의 기원이 되었을 만큼 부와 명예의 상징이었다.
만약 히치콕 감독이 한국을 배경으로 이 장면을 재해석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그는 주저 없이 1980년대의 새마을호를 선택했을 것이다. 당시 새마을호에는 순백의 식탁보 위로 웨이터가 정중하게 스테이크를 서빙하던,
할리우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던 최고급 식당칸이 있었기 때문이다.
1974년, 대한민국의 새마을호가 경부선을 달리기 시작했다. 이전의 ‘관광호’가 단순히 특급열차를 의미했다면, 새마을호는 시대 정신을 관통하는 이름이었다. 서울과 부산을 4시간 40분대로 좁히며 전국을 일일생활권으로
묶어낸 이 열차는, 상경과 출장, 발령을 위해 바삐 이동하는 산업역군들을 태운 새 시대의 상징이었다.
그해는 홍수환이 WBA 밴텀급 챔피언 타이틀을 차지하며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라는 포효로 온 국민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던 해이기도 하다. 아무리 가난해도 맨주먹과 투지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
새마을 운동의 ‘잘살아 보세’라는 구호가 사회 전반을 채우던 시기였다.
그 시절은 “야, 새마을호 타봤어?”라는 말 자체가 하나의 경험이자 자랑이었다. 그중에서도 새마을호 식당칸은 오늘날 비행기 일등석에 버금가는 서비스였다. 당시 기차 안에서의 식사라면 삶은 달걀이나 사이다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새마을호는 달랐다. 홍익회의 카트나 간이 매점이 아니라 정식 요리를 내놓는 ‘달리는 레스토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1980년대에 이르러 새마을호 식당칸은 화려함의 정점에 도달한다.
1986년 서울의 최고급 호텔이었던 서울프라자호텔(現 더 플라자)이 철도청과 계약을 맺고 직접 운영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하얀 식탁보가 깔린 테이블, 정장을 갖춰 입은 웨이터, 은색으로 빛나는 식기류까지, 그 풍경은
히치콕 영화 속 식당칸을 연상케 할 정도로 우아한 모습이었다.
메뉴 구성 또한 화려했다. 호텔 셰프가 주방에서 직접 요리한 함박스테이크, 안심스테이크부터 불고기 정식, 갈비탕 같은 한식까지 제공됐다. 수프와 샐러드, 빵, 메인 요리, 후식이 나오는 ‘풀코스 함박스테이크’는
선망의 대상이었다. 물론 가격은 만만치 않았다. 1980년대 함박스테이크 가격은 6,500원이었는데, 당시 짜장면 한 그릇이 800원 남짓하던 물가를 고려하면 누구나 쉽게 누릴 수 있는 식사는 아니었다.
새마을호 식당칸의 전성기는 짧게 끝났다. 수지타산을 이유로 식당칸은 도시락과 카페테리아로 축소되다가 결국 완전히 사라졌다. 더 빠르게, 더 생산적으로 이동해야 하는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기차 안에서의 여유로운
‘머무름’을 허락하지 않는다. 사실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로 두 시간 남짓이면 도착하는 지금은 굳이 기차에서 밥을 먹을 필요도 없다. 대신 우리는 부산에 가서 피자를 사고, 오는 길엔 대전에 들러 튀김소보로를
산다.
20~30년 후에는 지금의 이동 풍경 또한 과거의 한 조각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사라진 새마을호 식당칸을 애틋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TV 드라마 속 1980년대의 왁자지껄한 골목길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닮았다. 함께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온기를 나누고, 노력만 하면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이 올 것이라 굳게 믿던 시절이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어진 그 철길은 삶을 바꾸는 희망의 통로였고, 그 안의 식당칸은 그
시절 우리가 꿈꾸던 가장 우아한 목적지였다.